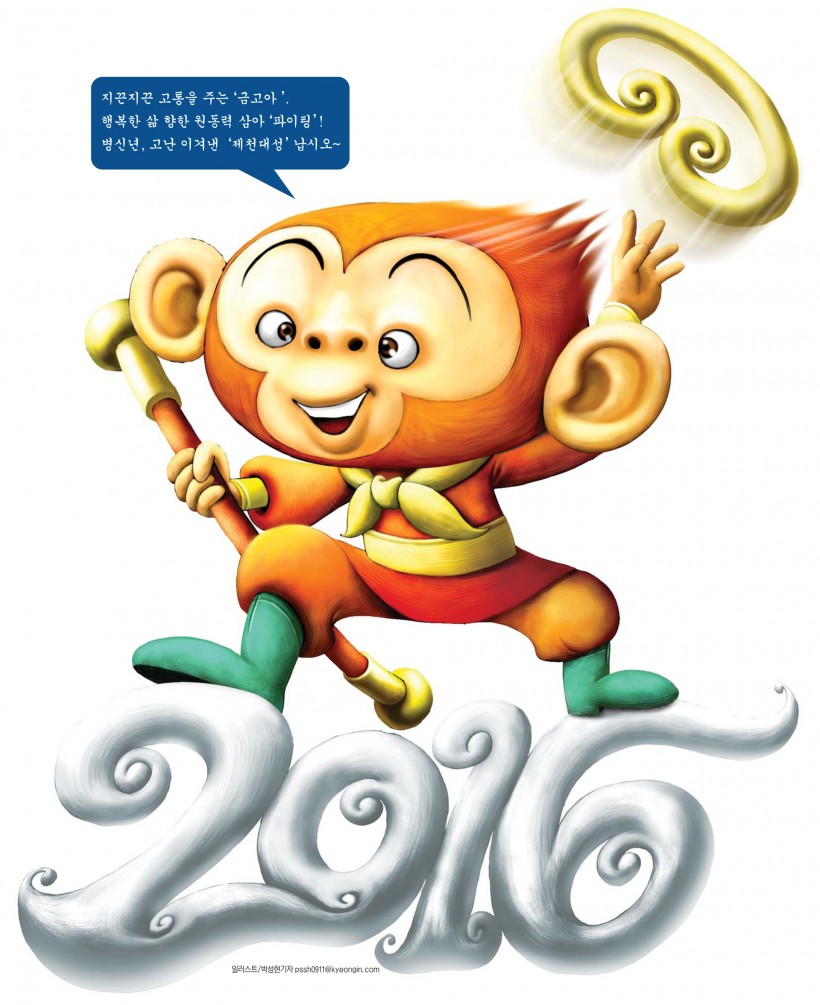
실직·집값하락등 우리 머리를 조이는 '걱정거리'
역경끝에 자유 얻은 손오공처럼 '금제' 떨치는 해
우리의 머리에는 손오공처럼 '금고아'가 씌어 있습니다.
성적, 취업, 실직, 집값 하락, 가계, 회사경영 등 걱정거리가 그 것이죠. 날마다 머리뼈를 조이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함께 서천에서 불경을 구한 후 금고아를 벗는데 우리의 금고아는 좀처럼 벗겨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벗으려고 발버둥치면 더 조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서유기의 이야기는 자칫 희망이데올로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올해가 붉은 원숭이의 해다 보니 고통받는 손오공에 쉽게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끈지끈 고통을 주는 금고아가 더 나은 삶을 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바꿔 생각해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금고아를 벗어든 이야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 몇 시간에 매겨지는 점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를 거부한 후 외길을 걸어 기능한국인에 선정된 이야기라든가 버려진 제품에 디자인을 입혀 쓸모 있는 물건으로 되살리는 업사이클러(Upcycler)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사례입니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팍팍한 가계살림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한 쪽 팔을 잃은 후 짝다리 등으로 일반 시중에서 신발을 구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 구두를 제작하는 스토리, 신의 직장으로 선망받는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눔운동가로 변신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금고아는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아닌 화려한 장신구였을 겁니다.
올해를 금고아를 벗는 원년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사회 곳곳에 퍼져있던 억눌린 금제(禁制)를 이겨내는 재주를 부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스스로 떨쳐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쑥 손 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해는 광복 71주년입니다. 칠흑 같았던 어둠이 걷힌 지 71년이 된 해입니다. 70+1의 의미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갈 때라는 뜻인 지도 모릅니다. 세밑 이야기가 장황했습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주 앉은 이의 머리에 쓰인 금고아를 어루만져 봅시다.
/사회부












![[기운생동 설] 김나인이 본 丙申年 국운과 띠별 총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2/20160204010001669_1.jpg)
![[기운생동 설] 배꼽웃음+사이다 전개 '코믹액션' 대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2/2016020301000269400012611.jpg)
![[기운생동 설] 경기·인천 문화예술공간 설맞이 행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2/20160202010001970000087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