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임기제 공무원이 공직의 폐쇄성을 깨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봉급 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 확보 위주로 인력과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군들은 변호사·노무사 자격증, 석·박사 학위 등의 전문 경력과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도 공무원 체계상 6급 정도의 직급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등 '특정직' 최소 5급↑ 임금
큰 성과땐 승진·최대 4년 계약 연장
英 '공직개방화' 목표 영구직 전환도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제가 처음 시작된 20년 전엔 안정적인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전문직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민간 시장에서 전문직의 대우가 계속 올라갈 동안 공직은 '공무원 직급 체계'에 갇혀 처우 변화 없이 채용 시장에서 뒤처졌다"며 "이렇다 보니 임기제 자리는 민간에서 퇴직해 생산성 떨어지는 인력들이 눌러앉는 한직이 되거나 미달된 직급은 보은성 인사의 자리를 대신 만드는 용도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임기제가 그저 공무원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닌 민간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기제가 공무원 봉급체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생산성 높은 전문 인력들이 자연스레 충원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난 인력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정직은 국가직, 지방직을 막론하고 최소 5급 사무관 이상의 급여 수준이 주어지며 업무 중요도와 채용예정자의 활동실적, 자격, 면허에 따라 보수가 추가로 달라진다. 일반직도 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 관련 전문교육과 평가 등을 필수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요건을 엄격히 관리한 일본은 임기부 직원의 비율을 국가 전체 공무원의 0.5%, 한국(2.1%)의 4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임기제 인력의 전문성 육성은 놓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문 자격분야도 '공무원 6급' 한계
직급체계 갇혀 처우 변화 없어 외면
'자유경쟁'을 추구해 임기제를 한국보다 앞서 시행한 서구권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계약임용' 형태로 임기제를 운영해 높은 성과를 보이는 인력의 경우 승진 인사가 가능하고, 임기에 상관없이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임기제 인력의 실적이 높아 계약 연장 사유가 명백할 때는 공석으로 만들 수 없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도록 법에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공직개방화'를 임기제 운영 목표로 두고, 실적과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영구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해 처우 만족도와 경쟁력을 높였다.
/취재팀
※취재팀: 지역사회부 김영래 부장, 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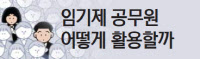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下)] '관행' 막을 대안 필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31010005505_1.jpg)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中)]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첫 등장… 지속되는 부작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3001001084600053061.jpg)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中)] 전문성 앞세웠지만… 내실은 글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30010005246_1.jpg)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上)] 민선 7기서 급증, 공직 비대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27010004792_1.jpg)
![[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上)] 일명 '어쩌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27010009829000482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