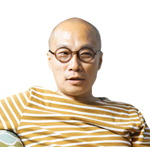
얼마 전 문학계에서 유명작가의 표절문제로 시끄러웠다. 이 작가의 표절 배경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작가만큼 다른 작가의 작품을 열심히 읽은 작가는 드물다. 최소한 자기 작품을 잘 쓰려고, 남의 작품을 열심히 읽은 건 사실이다. 물론 나 또한 표절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 분야 표절의 심각함을 바라보면서, 국악의 창작 계를 생각한다. 이곳엔 표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표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작곡가들의 자기복제다. 면밀히 따져보면 중견 작곡가의 자기복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국악관현악단에서 ‘초연’이라는 이름으로 연주한다. 거기에는 작곡가와 악단 간의 비생산적 공생이 존재할 뿐이다. 작곡가 혹은 악단의 정체(停滯)를 우려한다. 왜냐? 그것이 곧 국악관현악의 정체성(正體性) 혹은 지속적인 존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곡가들이 제발 타인의 작품도 들었으면 좋겠다. 예술계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고유한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얼마 전 한 국악 연주자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과 같은 대학의 국악교육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오히려 예전의 기생학교가 더 낫다.” 이 말에 공감한다. 예전의 기생학교에선 내 악기만, 내 전공만을 중시하지 않았다. 가(歌)·무(舞)·악(樂)을 두루 익혔다. 이렇게 학습했기에, 다른 장르에도 열려있고, 타인과의 협업도 수월하다. 지금의 국악관현악이야말로, 이런 인재와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작곡과 연주가 분리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악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연주형태로는 곤란하다.
2015년은 국악관현악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있는 해다. 국립국악원의 연주형태와 다른 국악관현악단의 시대를 열었던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50주년이 되는 해다. KBS국악관현악단은 30년이 되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년이 되었다. 저마다 성대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은 답답하다. 이들 단체가 국악관현악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21세기의 향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악관현악과 관계자들은 그럭저럭 십 년은 연명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국악관현악단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더 이상 국악관현악단의 수효는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에 진정한 창조가 존재치 않고, 당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국악관현악단은 무엇을 해야 할까? 위기임을 자성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바라건대, 국악관현악단 관계자들이 ‘부모’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아름다운 덕목은, 내가 잘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잘살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 최소한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곤란하지 않은가? 작곡가도 관현악단도, 더 이상의 자기 복제는 곤란하다. 그게 국악계의 부모로서, 국악을 하는 자식에게 떳떳해 지는 첫걸음이다.
/윤중강 평론가·연출가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