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춧돌, 인천5·3항쟁
광장, 다양성도 진화했다
시민회관 사거리 5만여명 “군부 퇴진”
각계 각층의 요구들 한꺼번에 표출
‘응원봉 집회’ 축제처럼 깃발 나부껴
조직보다 개인 참여… 민주주의 진일보

1986년 5월3일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시민회관사거리 일대에는 5만여 명이 운집했다.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모여들었다. 이날은 신민당 인천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예정돼 있었다. 거리로 나선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군부 독재 퇴진’과 ‘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같은 외침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 인권 운동가 등은 당시 정권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8시간 노동제 쟁취하자’ 등의 요구가 그것이다. 현수막과 유인물, 깃발 등을 통해 억눌렸던 분노가 그렇게 터져 나왔다.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도 그 현장에 있었다. 윤 교수는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조직이 총동원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기억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촛불광장의 모습은 1986년 인천5·3항쟁과 닮았다. 비상계엄령은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그 여파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공고하다고 여겨졌던 민주주의 원칙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수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촉구했다. 1986년 5월 인천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시민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존했다는 점도 많이 닮았다. ‘윤석열 퇴진’ 외에도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 ‘안전하게 살고 싶다’ ‘언론 자유 보장’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더해 2024~2025년 광장에선 깃발과 피켓, 촛불뿐 아니라 10~2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응원봉’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노조, 정당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 또는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성을 뽐내며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했다. ‘전국응원봉연합회’, ‘미국너구리연합 한국지부’, ‘걷는버섯동호회’, ‘나, 혼자 나온 시민’ 등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깃발이 광장에서 나부꼈다.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는 “인천5·3민주항쟁에서는 야당에 대한 실망, 군부 독재에서 겪은 고통 등이 맞물리면서 대학생,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총집결했다”며 “이전에도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으나,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한번에 분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서울, 인천 등에서 나타난 광장문화에선5·3항쟁이 보여준 ‘다양성’이 고스란히 이어졌다”며 “특히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개인 참여가 두드러졌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과거보다 더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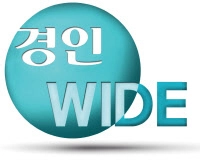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인 WIDE] 민주주의 주춧돌, 인천5·3항쟁 - 6월 항쟁 전신… ‘87년 체제’ 시발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1/news-p.v1.20250501.5350188106304e6f8449b843127492a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