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라이부르크, 재활용률 높이기 '안간힘'
일본, 차수벽 둘러싼 해수면에 묻어 '50년 사용'
사회적 비용 감안 경제적… 국내 법적근거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및 소각을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자원순환정책과 공공기관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 정책이 빛을 발휘해 쓰레기 대란을 모면한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독일의 소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모범적인 폐기물 관리로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룰 때 항상 우수 사례로 등장한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을 세분화해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민들은 폐기물 품목별로 각각의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된 품목은 품목별로 예정된 날짜에 수거하도록 설계돼 있다. → 표 참조

단순히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비닐 등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리병도 색깔별로 구분해 배출하고 종이도 일반과 퇴비화가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이런 노력 끝에 1992년 5만2천t이었던 폐기처리용 쓰레기 배출량이 2009년에는 2만7천500t으로 50%가량 감소했고, 재활용 쓰레기양은 같은 기간 1만7천t에서 2009년 6만500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즉 시민 개개인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려는 적극적 노력과 현대기술의 도입으로 생성된 폐기물의 약 69%가 재활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미나미혼모쿠 인근 해양에 처분장을 조성했다. 전체 넓이 16만4천㎡의 처분장에는 429만㎥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
면적은 수도권매립지의 1% 수준이지만 매립이 아닌 소각재 위주로 매립해 최장 50년간 사용 가능하다. 차수벽으로 둘러싸인 해수면에 소각재만 매립하고, 퇴적된 소각재만큼 수위가 상승한 바닷물을 정화해 차수벽 밖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매립이 진행된 후 처분장 내 소각재가 가득 차면 표면에 흙을 덮어 안정화한 뒤 항만 부지로 활용한다. 폐기물을 단순히 매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바다에 쓰레기를 매립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상 매립이 어렵다. 신규 매립지 건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보상비,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해상에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체 처리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내 특성상 님비(NIMBY) 현상으로 신규 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과 같은 해양처분장 조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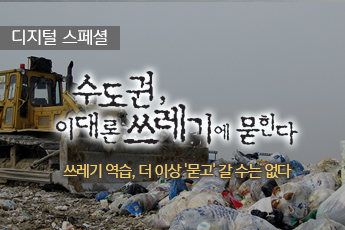
※기획취재팀
글: 이원근, 이준석, 공승배기자
사진: 강승호차장, 조재현, 김금보기자
편집: 김영준, 안광열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박성현, 성옥희차장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