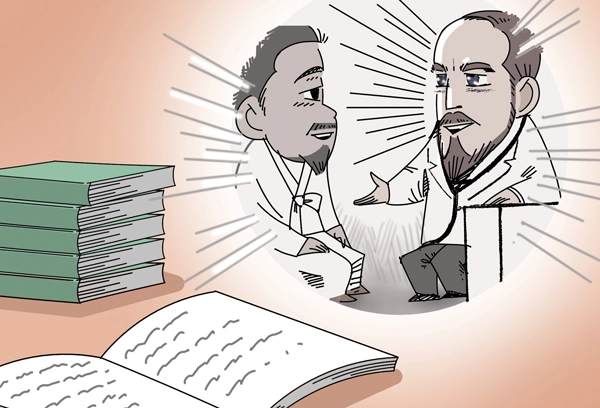
인천은 국제도시다. 공항이나 항만, 국제기구, 재외동포청, 외국 대학 등 인천이 국제도시임을 보여주는 것들은 많다. 그중에 ‘국제도시 인천’의 면모를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천 외국인묘지다. 인천 개항 11년 후인 1894년 ‘인천외인묘지규칙’이 공포됐고, 중구 북성동에 2천424㎡ 규모의 묘역이 마련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965년 연수구 청학동으로, 2017년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으로 옮겼다. 이 외국인묘지에 4월 16일이면 생각나는 인물, 닥터 랜디스(Eli Barr Landis, 1865.12.8~1898.4.16)가 있다.
인천에서 한국인들이 현대적 개념의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그 첫 번째가 영국 성공회의 ‘인천 영국병원’이다. 이 인천 영국병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게 닥터 랜디스였다. 랜디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태생으로 1888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랭커스터병원에서 근무했다. 미국인인 그가 영국 성공회와 연결된 것은 찰스 코프(Charles J. Corfe, 1843~1921) 주교를 만나면서다. 랜디스는 코프 주교와 함께 1890년 인천에 왔으며 곧바로 셋집을 얻어 의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인천에 터를 잡은 지 1년여 만인 1891년 10월 병원을 지었다. 성루가병원이었다. ‘낙선시의원(樂善施醫院)’이라고도 했다.
랜디스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 개원 직후인 1892년 그가 진료한 환자는 3천594명이었다. 1894년에는 4천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는 병원에 오는 환자만 진료한 게 아니라 환자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도 했다. 진료 이외에도 영어교육, 고아돌봄사업, 한국민속연구 등에도 매진했다. 한국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던 그는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했다. 젊디젊은 서른셋 나이에 장티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마도 한국인 환자에게 옮았으리라.
랜디스기념사업회가 지난해 인천에서 발족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인천 화도진도서관에서 랜디스 관련 연속 강좌를 마련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닥터 랜디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랜디스기념사업회는 그의 기일인 내일(16일) 오후 7시 대한성공회 인천 내동교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진오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