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한 실패로 이뤄낸 광복
‘철시 투쟁’ 18세 잡화상 김삼수 상고 이유서
조선총독부 일본 판사 꾸짖으며 최후의 저항
민중들은 재판 과정서 ‘사건의 존재’ 알게 돼
경인일보, 당시 기록·스케치 등 토대 취재

“중과부적으로 신체의 자유는 구속됐으나, 영특한 우리의 정신까지 움켜쥐고 밟을 수 있겠는가! 당당하게 정의·인도를 위해 행동한 우리들은 정의와 인도에 어긋나는 일본 사법권에 제한받을 수 없다. 따라서 1심, 2심에 불복한다.”
1919년 9월27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형사부 법정에서 18세 청년 김삼수는 이같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일본 판사들을 꾸짖으며 자신의 상고 이유를 밝혔다.
잡화상이었던 김삼수는 3·1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던 그해 3월6일 인천 시내 상점가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포들의 문을 닫는 ‘철시(撤市) 투쟁’에 나섰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 격인 고등법원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을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써내려간 상고이유서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다.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지금은 잊힌 독립운동가 김삼수의 최후 저항은 이렇듯 일제의 재판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립운동은 실패의 역사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수한 실패의 연속이 독립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자그맣게나마 살려 왔다. 그 불씨가 이어지고 모여 1945년 8월15일 마침내 해방의 빛을 되찾게 했다. 수많은 독립운동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광복의 불꽃을 키워낸 불쏘시개였다.
당대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감시망과 체포망을 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 각각의 종착지는 대부분의 경우 일제의 법정이었다. 그곳은 독립운동의 실패를 입증한 현장이 아니라 독립운동 탄압의 핵심 체계인 ‘일제 사법부’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의 또 한 번의 투쟁 공간이었다. 민중이 독립운동가와 사건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 또한 재판 과정이었다.
경인일보는 광복·창간 80주년을 맞아 그동안 관심이 뜸했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법정 투쟁에 주목한다.
앞서 소개한 청년 김삼수 이야기는 그 예고편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드러낼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재판 기록, 당시 언론이 스케치한 법정 풍경, 각종 연구 자료와 전문가 취재 등을 토대로 생생한 이야기를 되살리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1운동’의 지도자들에게 일제가 ‘내란죄’를 씌우려 했던 사법 탄압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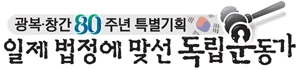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106년 전 평화 시위, 총독부 검사는 내란죄로 기소했다 [일제 법정에 맞선 독립운동가·(1)]](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0b25c3e49f3942cd96920a27786673a2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