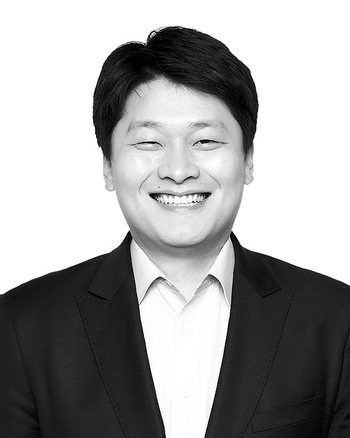
2010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가치총액은 18조원이 넘는다. 1998년에 비해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미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70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가치는 2009년에도 상승했다. 물론 적자를 보는 구단도 있다. 그러나 보통 1년에 1~2개 구단에 불과하다. 적자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만약, 메이저리그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LG전자보다 많고, 한국전력보다 적다. 순위로 매기면, 12위이다. 최고의 인기 구단인 뉴욕 양키스의 구단 가치는 2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포털업체 다음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메이저리그는 더이상 스포츠가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industry)이다. 야구가 산업으로 번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스포츠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구단이 돈이 많다면 더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에 승리하게 되면, 관중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 또 경기장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 투자한다. 더 많은 관중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의 발전은 자본주의에 있지 않다.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동반 성장에 있다. 1869년 처음으로 프로구단이 창단됐다. 이후 자본주의가 활개를 쳤다. 대도시에 연고를 둔 구단은 승승장구했다. 부자구단은 돈으로 선수를 얼마든지 맘대로 샀다. 그래서 팀간 실력 차이는 더욱 커졌다. 관중은 등을 돌렸다. 승부가 빤한 경기는 지겹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65년에 도입된 신인 드래프트 제도다. 전년의 성적 역순으로 우수한 신인을 먼저 뽑게 하는 제도다. 부자구단이 돈으로 선수를 쓸어모으지 못하게 됐다. 지금이야 어느 나라든, 어느 종목이든 프로는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를 뽑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프로야구가 생긴지 100년이 돼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적자 구단이 절반에 달했다. 수익배분제도와 사치세가 도입됐다. 부자구단이 가난한 구단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최고의 인기 구단인 뉴욕 양키스는 수익의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뉴욕 양키스는 매년 사치세도 낸다. 구단 연봉 총액이 메이저리그가 정한 상한액을 넘기 때문이다. 양키스가 낸 수익의 일부와 사치세는 시장 규모가 작은 가난한 구단을 먹여 살린다.
뉴욕 양키스가 수익의 일부를 내놓고, 사치세를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포츠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구단도 경기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파트너도 일정 수준을 갖추면 더 재밌는 경기가 된다. 가난한 구단이 강해야 자기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동반성장이다.
2011년 한국의 사회적 이슈는 동반성장이었다. 아직도 대기업의 논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야구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계속됐다면 메이저리그는 단순한 야구리그에 불과했을 것이다. 대기업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 자본주의 논리 뒤에 꼭꼭 숨었다. 경쟁력있는 기업의 승자 독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큰 착각이다. 혼자서는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없다. 자본주의 꽃인 프로야구도 성장을 위한 규제가 있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메이저리그가 그러하듯 '모두가 함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만드는 부품이 필요하다. 강자의 위치에서 납품 가격을 깎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키스가 혼자 야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당한 가격을 쳐주어야 소비도 활발해진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소비자가 되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한국경제가 바라는 동반성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