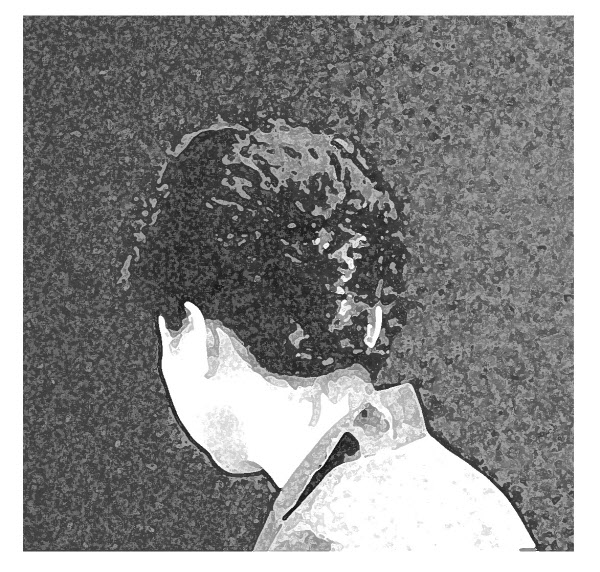
'가엾은 영애' 이미지시효 끝난듯
더이상 아버지 불의로 잃은 것도
신군부에 의해 강제 유폐된 것도
야당으로 천막당사 지킨것도 아냐
권력 주어진 순간부터 여일하게
자의식 없이 비극 스스로 만든것

우리 정치사를 돌아볼 때 비극적 인물은 결코 적지 않다. 말 그대로의 비극에 충실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더라도, 궁극적 몰락의 비극성 때문에 사람들 뇌리에 깊이 기억되는 이들은 여럿 있을 것이다. 오래 전, 많은 이들은 아버지를 불의에 여읜 '가엾은 영애'를 두고 그야말로 한없는 연민을 가졌다. 그 대상이 온갖 고난과 굴곡을 넘어 현실 정치인으로 나타났을 때, 그 연민은 그녀에게 어마어마한 후광이자 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녀의 정치 역량보다는 자신들 마음 속에 만들어져 있던 그녀의 이미지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면서 그녀를 최고 권력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결국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이성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의 개입에 의해 주인공이 파멸에 이르는 사례를 많이 보여준다. 물론 주인공이 운명의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패배해가는 서사가 그 안에는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 이 경우를 일러 '운명비극'이라 부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처럼 주인공 스스로 초래한 비극도 없지는 않다. 이 경우는 가혹한 운명에 의해 벌어진 비극이라기보다는 주인공 스스로의 결함이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일러 '성격비극'이라고 한다. 물론 그리스 비극에도 성격비극의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와 반대로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은 주인공 자신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비극적 파멸을 맞게 되는 때가 많다. 오셀로는 격한 질투심으로, 맥베스는 권력을 향한 거센 집착으로, 샤일록은 돈을 향한 턱없는 욕망으로, 햄릿은 성격적 우유부단과 망설임으로 비극적 몰락을 맞는다.
우리는 '가엾은 영애'의 비극이 비교적 '운명비극'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최고 권력에 선 그녀가 불러온 비극은 현저하게 '성격비극'에 근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견고한 독재체제(dictatorship)를 구축하면서 최고 통치자로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심각하게 오용하였다. 특정 개인과 소집단이 국정을 구상하고, 각료들은 군말 없이 수행하는 기형적 통치 형태를 집권 시절 내내 고수하였다. 반성적 자의식이 결여된 이러한 오도된 의사 결정과 실행 구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비극을 낳았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녀는, 그 말이 훗날 자신을 향하게 될 줄 과연 짐작이나 했을까?
어쩌면 그녀의 마음 속에는 운명비극의 주인공인 자신에 대한 자기연민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를 아직도 운명비극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가엾은 영애' 이미지는 시효가 마감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비극은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신의 징벌도 아니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초월적 힘에 의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함으로 스스로에게 패배한 것이다. 더 이상 아버지가 불의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신군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폐된 것도 아니고, 야당 정치인으로 추운 거리에 나와 천막당사를 지켜야 했던 것도 아니다. 권력이 주어진 순간부터 여일하게, 정점의 자리에서, 반성적 자의식 없이,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