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 마운드 운용도 '독으로'
1992년 이광환 감독 부임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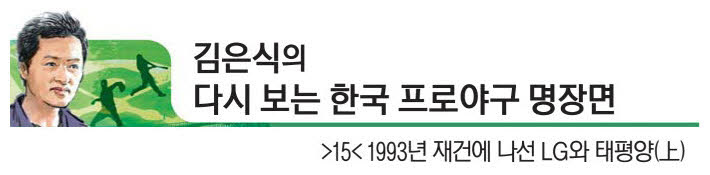
선동열이 부상으로 이탈했던 1992년 정상 고지에서 내려서야 했던 해태는, 이번에는 마무리투수로 재기해 0.73이라는 역대 최저 평균자책점 기록을 세운 선동열의 힘으로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선동열이 완벽하게 뒷문을 틀어막자 온기가 선발진으로까지 번지며 다승왕 조계현을 필두로 송유석, 김정수, 이강철, 이대진까지 무려 다섯 명의 10승 대 투수가 배출됐다(선동열 자신까지 모두 여섯 명이 10승 이상을 기록).
그런 압도적인 마운드 아래서는 팀 타율이 2할5푼에 턱걸이한 물 방망이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없었다.
우승은 늘 그런 압도적인 위력의 에이스가 가져다주는 선물이었다.
원년 OB는 우승의 제단에 박철순의 허리를 내놓았고, 1984년 롯데는 최동원의 어깨를 바쳤다.
그리고 1986년부터 해태의 왕조시대가 시작된 이래 잠시나마 그 숨 막히는 행군을 멈춰 세운 것은 한 편으로는 선동열의 부상이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LG와 롯데에 내려진 김태원과 김용수, 염종석과 박동희 같은 '벼락같은' 축복이었다.
하지만 1993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축복과 동떨어진 침침한 변두리에서 묵묵히 전진했던 이들에 의해 또 다른 길이 개척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듬해 패권의 주인공이 되는 LG,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대항마가 되는 태평양 돌핀스에 관한 이야기다.
1990년에 창단하자마자 해태의 5년 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왕좌에 올랐던 트윈스는 1991년 6위, 1992년에는 7위로 전락하며 바닥을 기어야 했다.
선수단의 명단은 1990년 우승 당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김재박과 이광은이 1991년을 끝으로 각각 팀을 떠나면서 내야진을 새로 꾸려야 하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20대 선수들과 20대 못지않은 내구력의 김용수, 정삼흠으로 꾸려진 투수진만큼은 우승 당시보다 못할 것이 없었다.
타격이 약하고 수비조직력이 흐트러진 팀이 정상을 넘볼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단단한 투수진을 보유한 팀이 하위권으로 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기 드문 일이다.
LG가 첫 우승 이후 두 해 동안 오히려 뒷걸음질을 쳐야 했던 것은 오로지 투수들이 돌아가며 전력에서 이탈하는 부상과 부진의 릴레이 때문이었다.
물론 그 부상과 부진이란 상당부분'내년을 생각하지 않는' 임기응변식 마운드 운용 때문이었고, 그래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몸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에 18승을 올리며 정규시즌을 이끌었던 김태원은 이듬해 8승으로 주저앉았고, 12승을 올린 데 이어 한국시리즈에서 다시 2승을 거둬 MVP가 되었던 김용수도 1992년에는 세이브 없이 5승으로 내려앉았다.
각자 훈련에 전념할 수 없었던 개인사정이나 크고 작은 부상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 우승 당시 23세이브를 기록했던 정삼흠이 1991년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내리 세 번이나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고 갑작스레 선발진으로 복귀하면서 투수들의 보직이 한꺼번에 뒤엉켰던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92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광환 감독이 '돌발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마운드'를 구상하게 했던 배경이었다.
/김은식 야구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