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단들, 수백억 가입금 텃세
정회장 '제 2리그' 창설 파격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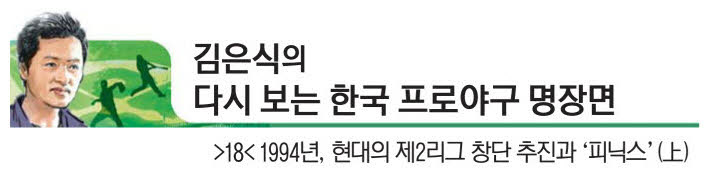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정 회장의 고향인 강원도 지역까지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팀을 맡아 달라는 프로야구 추진세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원년부터 만루홈런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박철순과 최동원의 투혼이 드라마를 연출해내면서 프로야구가 모두의 예상을 깬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을 때도 정주영 회장의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89년 MBC가 매물로 나왔을 때도 '적자기업은 인수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반복해 프로야구무대에 '저렴하게' 입성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기도 했다.
하지만 1992년에 벌어졌던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게 된다. 그 해 봄 정주영 회장은 국민당을 창당해 직접 '정권 접수'에 나서게 되고, 국민당은 불과 창당 한 달여 만에 참가한 14대 총선에서 31석을 확보해 일약 3당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해 겨울 대선에서는 '반값아파트'와 '공산당 합법화', 혹은 '사재 2조 원 국가헌납' 등의 파격적인 공약과 안기부가 개입된 '초원복국집'에서의 관권선거공작을 도청해내 폭로할 정도의 정보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파란을 일으키며 김영삼, 김대중과 더불어 '빅3'로 군림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모은 400만 표는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는 3위 낙선이었다.
정권 핵심층의 관권선거공작을 도청할 만큼의 배짱을 부리고도 낙선한 정주영은 곧 정치 이력을 1년 만에 마감하고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그리고 그가 직면해야 했던 문제는 마치 총수의 사조직처럼 움직였던 현대그룹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국민당의 외곽조직 혹은 패잔병조직 정도로 전락한 대외적인 그룹의 이미지였다.
정주영 회장은 경영에 복귀해 처음으로 가진 사장단 회의에서 '임직원들의 사기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스포츠에 주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각 종목별 스포츠협회의 후원자를 찾기에 골몰하고 있던 정권의 고민을 풀어주며 자연스럽게 화해무드를 만들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다.
그래서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축구협회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정세영 그룹회장(수상스키), 박재면 현대건설회장(수영), 이내흔 현대건설사장(역도), 이현태 현대석유화학회장(아마야구) 등이 일시에 스포츠계로 산개하게 된 것이 그 무렵이었다.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이 9년째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것을 합치면 무려 여섯 종목의 수장을 현대그룹이 휩쓸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단 창단 작업은 내내 헛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기존에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던 여덟 개의 기업들은 굳이 현대라는 강력하고도 껄끄러운 경쟁자를 끌어들이면서까지9, 10구단으로 리그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구단들은 7구단으로 빙그레가 가입할 당시 30억 수준이었던 리그 가입금을 많게는 400억까지 불러대며 어깃장을 놓았다. 그런 텃세에 허리를 굽힐 사람이 아니었던 정주영 회장의 선택은 '제2의 프로야구리그 창설'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획이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양대리그' 역시 기존의 프로야구 질서 밖에서 후발주자들이 나름의 독자적인 리그를 만들어 대항하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현대의 발상이 황당무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애초에 '사업'보다는 '정책'으로서 출범한 한국의 프로야구에서 그것은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기획이었든, 아니면 단지 또 다른 노림수를 위해 외곽을 때리는 명분이었든, 현대가 '새로운 리그를 만들 만큼의'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이상 한국야구계는 격랑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었다.
/김은식 야구작가












![[김은식의 다시 보는 한국 프로야구 명장면·14]연습생 출신 홈런왕 신화(下)](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7/20180730010021167001016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