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 기종 보잉·에어버스가 제조… 수리땐 美·유럽기관 인증이 필요
中 '드론굴기' 부정적… 촬영·분석 등 활용기술 중요 '국내기업 경쟁력'
국내 첫 인천 인증센터 "앵커시설될 것"… 외국 연구개발 교류창구도
국토부 민관협의체 간사 맡아…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에 매진

하지만 항공기·부품 제작이나 항공 '정비·수리·분해조립'(MRO) 부문의 성과는 미미하다.
항공기는 수입하고, 항공기를 구성하는 수십만 개 부품 중 국산은 거의 없다. 항공 MRO 부문 역시 정부와 인천시 등이 '활성화'를 외치지만 아직 성과가 크지 않다.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제작', '운송', 'MRO' 등이 어우러진 항공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열쇠로 '인증'을 꼽았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전신은 2013년 설립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다. 이듬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설립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민간 항공기, 공항, 항행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한다.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을 분석하고, 첨단 항공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연명 원장은 "우리나라 민간 항공 산업의 'A to Z'는 인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기 부품 인증은 항공기 제작과 MRO 등 국내 항공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내 항공 산업은 군수용(軍需用)에 치우쳐 있다. 우리나라는 수리온 등 군수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를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민간 항공 분야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제작하고, 이 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선 '국제 인증' 획득이 필수다. 민간 항공기는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항공 분야 인증은 미국 연방항공국(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유럽 항공안전청(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의 인증을 받은 항공기만 전 세계 항공을 누빌 수 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도 마찬가지다.
김연명 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항공기 인증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선 미국이나 유럽과 협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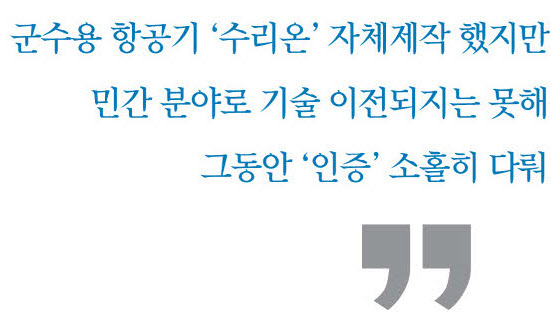
그는 '컵홀더'를 예로 들었다. 여객기 좌석마다 있는 컵홀더의 가격은 약 200달러다. 겉으로 보기엔 시중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증을 받으면 가격이 10배 이상 뛴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 인증을 획득한 후 국가 간 협정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산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제작과 부품 제조, MRO도 마찬가지"라며 "국내 모든 민간 항공기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정비하기 위해선 미국·유럽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원은 민간 항공기 인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인천'은 국내 항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연명 원장은 전망했다.
항공 산업을 구성하는 제작·운송·MRO는 항공기가 많이 뜨고 내리는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김포국제공항과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도 항공 MRO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 인천의 MRO 산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는 국내 최초 '드론인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드론은 민간 항공기를 중심으로 한 항공 산업과 달리 아직 '블루오션'이라는 게 김연명 원장 설명이다. 인천에 건립되는 드론인증센터는 우리나라가 세계 드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중국이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중국이 레저용 기체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지만, 드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나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체 제작뿐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 촬영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 분야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드론 인증' 부문은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이 없다. 김연명 원장은 "외국에도 드론인증센터와 같은 시설·기관이 많지 않다"며 "우리 드론인증센터는 선제적으로 드론 관련 인증 체계를 갖추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 우리의 인증 체계가 글로벌 인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원장은 드론인증센터가 드론 산업의 앵커 시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드론 관련 기업·기관을 집적하고, 외국과 연구개발·교육 등을 교류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AV(Personal Air Vehicle·개인비행체)는 드론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가 민간 항공기보다 작지만 드론보다 크다. 아직 국내에서 상업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PAV를 토대로 한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UAM은 개발·제조·판매·인프라 구축·서비스 등 PAV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인천시와 서울시, 인천공항공사 등 40여 개 관계 중앙부처·지자체·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UAM Team Korea'가 발족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UAM을 상용화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인천공항~여의도 노선을 시범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김연명 원장은 "UAM은 상용화까지 많은 과제가 있다"며 "안전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도심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보안·환경·프라이버시 등 많은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은 생소할 수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UAM이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은 UAM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산업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연명 원장은 "관계 법령과 정부 방침을 원칙적으로 준수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인천은 인천공항·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어 항공사와 항공 정비 산업체들이 집중돼 있다. 인천을 벗어나면 업무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은 드론 산업 육성의 핵심 지역이며,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혁신 성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연명 원장은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이것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을 고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소통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글/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김연명 원장은?
- 학력·경력
▲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 전공, 교통계획학 석사
▲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교통공학 박사
▲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2004~2007)
▲ 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연구본부장(2018)
▲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2018.4~현재)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2016~현재)
- 주요 연구
▲ 인천공항 마스터플랜 연구(2007)
▲ 필리핀 클라크공항 마스터플랜 연구(2008)
▲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2010)
▲ 제1·2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11, 2016)













![[인터뷰… 공감]'K4리그 돌풍' FC남동 초대 사령탑 김정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6/20200623010010925000539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