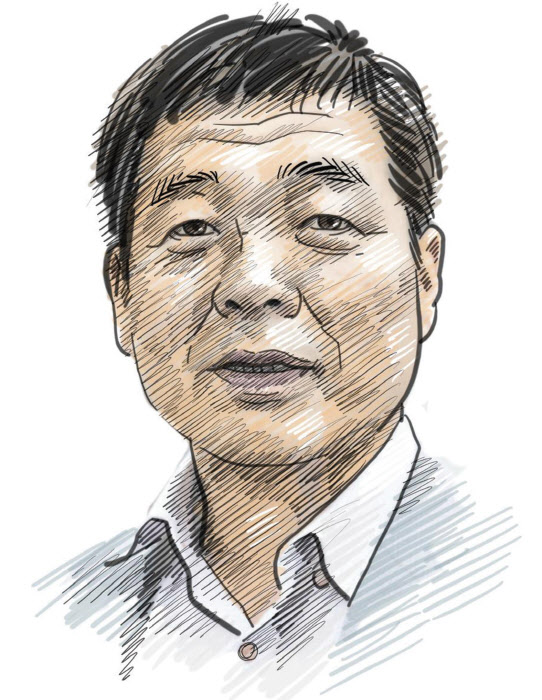
꽃과 가시가 한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글을 읽는 동안
지금은 다른 몸이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시간을 생각하는 동안
꽃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가시를 품는 것이라는 것을 새기는 동안
꽃이 오셨다
어쩌지 못하고 물외처럼 순해지며 아픈 내 마음이며
줄기와 잎이 가시로 덮였어도 외꽃처럼 고울 그대에 대한 생각이며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몸의 그리움을 마음의 그늘로 염하는 시간이며
이대흠(1967~)

이처럼 가시를 간직하고 꽃을 피우는 외꽃은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애증과 같이 동시에 사랑과 미움을 가진다. 고통이 없으면 쾌락도 없는 것같이 꽃을 피우기 위해 가시가 필요한 것으로 서로를 위해 서로가 공존한다.
마치 "꽃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가시를 품는 것"처럼 당신의 사람이 '줄기와 잎이 가시로 덮였어도' 사랑하는 연유도 그러하다. 이별처럼 그 꽃이 떨어진 후에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몸의 그리움'으로 있는 것은 가시만 남아 버린 증표이기 때문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1대 대선 TV 토론] 후보별 모두 발언 키워드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8/rcv.YNA.20250518.PYH2025051812150001300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