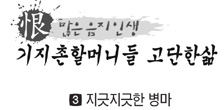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 언덕 옆 골목길에는 낡은 판잣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보통 6~7개의 쪽방이 있는 판잣집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집단으로 생활해왔지만 지금은 미군이 빠져 나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언덕을 따라 한참을 오른 뒤 부대 담장 바로 밑에 있는 한 판잣집에 들어섰다. 꽃다운 나이에 이 집 11개의 쪽방에 들어왔던 방주인들은 돌봐주는 이 없이 늙고 병들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4명의 할머니만이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빼벌 최초의 기지촌 여성으로 알려진 윤순자(83·가명) 할머니.

하지만 주위의 손가락질과 놀림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는 것이 힘들었던 윤 할머니는 결국 초등학교 때 하나뿐인 혈육을 미국으로 입양보냈다.
"정말 키워보고 싶었어. 하지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이 낫다고 생각했지."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윤 할머니는 위궤양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번씩 의료원을 다니고 있다.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다. 주위에서는 윤 할머니의 병이 암이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바로 옆 쪽방에 살고 있는 고현성(76·가명) 할머니. 수년 전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긴 기억상실증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고향인 개성에서 19살 때 피란 온 고 할머니도 서울 거리를 떠돌다 먹고살기 위해 이곳 빼벌까지 오게 됐다.
"혼자여선지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미군하고 살 때 수술까지 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마도 우리 일 때문일겁니다."
고 할머니를 옆에서 돌봐주고 있는 전춘자(68·가명) 할머니는 최근 기관지염까지 생겨 고생하는 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 빼벌에 들어온 전 할머니도 몇 명의 미군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그 역시 혼자다. 몇년 전부터 갑상선염까지 생겨 고통을 받고 있는 전 할머니는 일반 병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한달 20만~30만원의 돈이 전부인 상태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월세 15만원과 난방비 10만원을 쓰고 나면 도저히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어쩌겠습니까. '선택한 삶이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도 늘 입안에서만 맴 돌아요."



![[6·3대선 어젠다] 한반도 비핵화-전술핵 재배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5/ams.001.photo.202409251322306020005947_R.jpeg)

![[포토&스토리] 인권유린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5/news-p.v1.20250515.39700b6feaf74efc8efc61bafc447dd4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