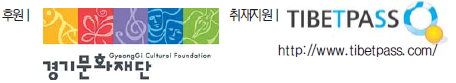한국인에게 티베트는 '미지의 문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티베트와 한국은 수천 ㎞가 떨어져 있어 쉽게 갈 수 없는 미지의 땅이다. 티베트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없다. 인도로 망명해 티베트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達賴喇痲)'의 나라라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 이번 기획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취재팀은 티베트의 정치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라싸(拉薩)는 물론, 수백 ㎞의 장도에 올라 체탕(澤當)과 시가체(日喀則), 장체(江孜)라는 주요 도시들을 찾아 나섰다.
이 도시들을 방문하며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티베트 불교와 그들의 역사를 추적했다. '밀교(密敎)'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 불교,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 티베트인들의 전통 사상 역할을 했던 원시 종교인 '본교(本敎)'를 소개하며, 한국불교와도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 우리는 티베트를 대표하는 '달라이 라마'와 관련한 문화재들에 국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체탕을 방문해 티베트 민족 탄생 신화와 티베트 최초의 왕궁인 윰부라캉(雍佈拉康), 티베트 최초의 법당 창주사(昌珠寺)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달라이라마'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던 라싸의 탄생 비화, 달라이 라마에 가려져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판첸라마(班禪額爾德尼)' 등은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길가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두 무릎과 두 팔,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절)를 하며 라싸로 가고 있는 티베트인들을 보며 그들의 신앙심에 감동받기도 했다. 순례자들은 수백 ㎞를 수년에 걸쳐 오체투지로 가고 있지만 힘든 내색 보다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미소는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평생 한 번 이상 오체투지로 라싸로의 순례길을 떠나는 티베트인들은 힘든 그 순례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결국 티베트인들에게 성도(城都) 라싸는 정치와 행정, 문화의 중심지를 넘어 '성지(聖地)'였던 것이다.
길가에서 만난 티베트 전통 마을에서 현대 문명의 이기(利器)를 버리고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생활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이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수장(水葬-사람의 사체를 물속에 묻는 장사법) 풍습과 천장(天葬, 조장(鳥葬)이라고도 하며 티베트인들은 시신(屍身)을 신성(神聖)한 독수리가 먹어 치우면, 바로 승천(昇天)하거나 아니면 부귀한 집안에 잉태되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풍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고, 도로 곁에는 죽은이들의 명복을 비는 그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중국은 티베트를 서쪽의 보물창고라는 뜻의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라고 부른다. 중국인들이 티베트를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것은 티베트 고원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아닌 수천 년째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느 보물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인에게 미지의 문명으로 남아 있는 티베트의 문화와 역사, 종교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정돼 있는 지면으로 인해 독자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12회의 연재를 마치며 그동안 애독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글┃김종화기자·사진┃임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