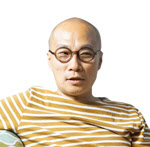
이난영 하면 ‘목포의 눈물’(1935)을 떠올릴 거다. 더 안다면 ‘다방의 푸른 꿈’(1939)을 얘기한다. 일제강점기의 트로트의 대표곡을 부른 가수이자, 블루스의 원조 격인 노래를 이난영이 부른 게 많다. 그녀는 실제 일제강점기의 유행 장르인 가요, 민요, 만요, 재즈를 두루 넘나들었다. 앳된 목소리로 부른 ‘아리랑’과 ‘신아리랑’, 한 편의 드라마가 연상되는 ‘담배집 처녀’와 ‘알아달라우요’, 남편 김해송과 함께 부른 ‘명랑한 젊은날’, ‘올팡갈팡’을 들어보라. 조선의 여가수 중에서, 이렇게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가수는 이후에도 드물다.
샹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1915~ 1963)와 이난영 사이에는 평행이론이 존재한다. 둘 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그녀들의 이름이 모두 타인이 붙여준 예명이다. 버거운 현실을 잊게 해준 이름이었다. 모두 탁월한 음악성으로 전성기를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 에디트 피아프의 주변에 이브 몽탕이 있었다면, 이난영에겐 남인수란 가수가 있었다. 남편 김해송이 한국전쟁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면서 살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에디트 피아프나 이난영이나 가수가 본업이었으나, 연기에도 출중했다. 카르멘이 아닌, 남자 역할 돈호세를 할 수 있는 여배우였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은 불우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점이다. 에디트 피아프와 이난영의 노래를 다시 부른 사람은 많지만, 그녀들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난 이듬해 이난영이 태어났고, 에디트 피아프가 타계한 이듬해에 이난영이 세상을 떠났다. 파리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에서 거행된 장례식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것처럼, 집회가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에도 이난영이 떠나는 영결식에 많은 시민이 애도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여가수의 평행이론을 인정하는가? 지금의 우리는 프랑스의 에디트 피아프처럼 한국의 이난영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사람이 에디트 피아프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난영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게 이런 명가수가 있었다. 이난영은 진정 ‘격이 다른’ 노래를 불렀다.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6년, 이난영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전쟁 당시, 이난영은 남편 김해송(1911~1950)을 떠나보내고 김시스터즈를 길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에드설리반쇼에 출연해서 딸들인 김시스터즈와 함께 아리랑을 가사로 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에 관해선 다큐멘터리 ‘다방의 푸른 꿈’(김대현 감독, 2015)에 잘 담겨있다.
2016년, 경향각지에서 이난영을 기리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영화, 연극, 가요, 국악분야에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난영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 에디트 피아프와 미조라 히바리가 각기 그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윤중강 평론가·연출가




![정치 개혁, 지방분권 강화 [6·3대선 어젠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1/news-p.v1.20250511.b6378809ac6b4230b5ee323f209b973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