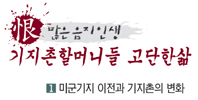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은 것이라곤 쭈글쭈글해진 몸뚱이와 지긋지긋 한 병마 뿐. 차가운 쪽방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이들 기지촌 할머니들의 질곡의 삶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이라크전쟁으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파주·동두천·의정부 등지의 경기북부 주요 미군 기지촌에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하지만 환갑도 훨씬 지난 기지촌여성 출신 할머니들이 기지촌을 떠나지 못한 채 집단으로 몰려 사는 곳이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택지개발지역을 지나 도착한 빼벌 마을은 영락없는 70년대의 허름한 동네,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미군 캠프 스탠리 정문으로 가는 폭 5 정도의 도로를 따라 단층의 세탁소,튀김집,양품점 등이 눈에 들어왔다. 최소 병력만 남기고 미군이 모두 빠져나간 부대 앞은 사람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을 만큼 썰렁했다.
가게 뒤편으로 2명이 가까스로 함께 걸어 갈 수 있을 정도 넓이의 뒷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 집 벽마다 컬러 스프레이로 'Amazing house','LA club'등 미군을 끌기위한 문구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잠시후 ,낯선 이를 보려는 눈이 쪽문을 빠끔히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한결같이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었다.
빼벌에는 현재 23명의 기지촌여성 출신 할머니들이 모여 산다.
빼벌이 좋아서가 아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할머니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70년대 수천명에 달하던 기지촌 여성들은 지금 모두 자취를 감췄고 현재 관계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은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53명이 지역별로 집단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대 사회복지과 박수경(42)교수는 "70년대 '양공주'로 불렸던 기지촌여성들은 당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정부의 지원과 묵인하에 달러벌이 전선에 서 있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 대한 사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은 전혀 없다"면서 "슬픈 과거로 치부해 외면하기보다는 이들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대선 어젠다] 한반도 비핵화-전술핵 재배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5/ams.001.photo.202409251322306020005947_R.jpeg)

![[포토&스토리] 인권유린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5/news-p.v1.20250515.39700b6feaf74efc8efc61bafc447dd4_R.jpeg)







![[기지촌할머니들 고단한삶]기지촌 변천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704/327062_39092_6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