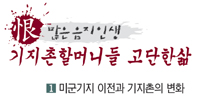
속칭 양공주와 양색시로 불렸던 이들 대부분은 가족을 먹여살리기위해, 또는 동생 학비를 벌기위해 상경했다 인신매매단에 잡혀 기지촌으로 유입됐거나 자발적으로 기지촌 주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
이들 모두는 좋은 미군을 만나 이민가는 것을 유일한 탈출구로 동경했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기지촌이 형성됐고 이들 기지촌에서 흘러나온 외화는 한국 경제의 기틀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군을 국내에 잡아두려는 정부의 속내가 맞아떨어지면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실제 지난 71년 미군은 한국 정부에 기지촌 정화사업을 요구했다. 미군들이 불결한 환경속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군 철수설이 나오던 60년대말 6만2천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이 4만5천여명으로 줄어 불안해하던 한국 정부는 미군의 이런 정화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국 기지촌에 성병 진료소를 세우도록했고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군 상대 에티켓과 행동요령을 교육했다. 정부가 기지촌 매춘에 깊숙이 개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을 벌여나가면서 기지촌 매춘은 공창의 성격을 갖게 됐다.
이후 80년말부터 기지촌 매춘은 과거 전통적인 매춘과는 전혀 다른 산업형의 성격을 띠게 됐다.
유입되는 여성들도 생계형보다는 호스티스, 마사지걸 등 서비스형 종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은 철저히 '돈'에 따라 움직여 이직도 심했다.
특히 90년대 접어들면서 미군이 기지촌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윤금이씨 사건 등이 터지자 위험하고 보수가 적은 기지촌에서 한국 여성들이 급격히 떠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후 포주들은 이 공백을 현재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들을 통해 메워나가고 있다.



![[6·3대선 어젠다] 한반도 비핵화-전술핵 재배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5/ams.001.photo.202409251322306020005947_R.jpeg)

![[포토&스토리] 인권유린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15/news-p.v1.20250515.39700b6feaf74efc8efc61bafc447dd4_R.jpeg)







![[기지촌할머니들 고단한삶·미군기지 이전과 기지촌의 변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704/327050_39083_5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