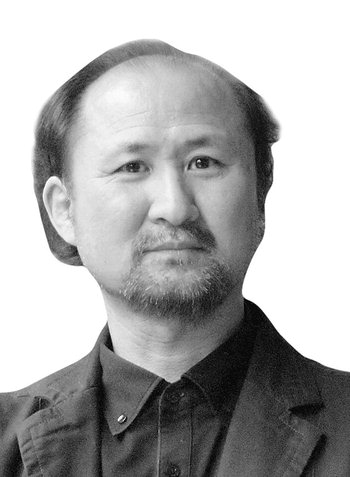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은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건물을 비롯하여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재생했고, 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은 1890년에 세운 일본18은행의 내부를 개조한 것이다. 4년전 배다리에 둥지를 튼 스페이스 빔은 1927년 지어진 인천양조장 건물이며, 이번 개관한 유네스코 A 포트는 1930년대에 지은 신포동 골목의 낡은 이층 목조건물이다. 근년 들어 이곳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구 도심의 옛 건물과 폐쇄된 공장, 창고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간, 창작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팩토리 조성 사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쇠락한 도심의 폐허를 문화예술의 산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928년에 세운 구 대법원 청사를 일부 개축한 것이며, 남현동 남서울분관은 1905년 회현동에 건립했다가 후에 지금의 장소로 이전 복원한 구 벨기에 영사관 건물이다. 구 서울역사는 올 8월 개관을 목표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다 서울 문래동의 공장지대는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 작업공간으로 변모시켰다.
해외의 사례는 더욱 많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무기공장을 예술특구로 변신시킨 베이징의 따산즈 798과 일본의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 삿포로 맥주공장을 재활용한 삿포로팩토리가 있다.
유럽의 경우 폐쇄된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120년 역사의 낡은 방직공장을 100여개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독일 라이프치히의 슈피너라이, 철도역을 개조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등이 유명하다.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관 PS1도 초등학교건물을 개조한 것이며, 맨해튼의 공장지대였던 첼시지역이 화랑가로 탈바꿈한 것이나 브루클린의 낡은 공장건물들은 최근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또 과자공장을 개조한 뉴욕시 북쪽 허드슨강변의 현대미술관 디아 비콘(Dia Beacon)은 필자가 다녀 본 여러 미술관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의 하나였다.
이러한 옛 도심의 낡은 건물이나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도시재생의 핵심적 대안이자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근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고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이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만남을 통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편의와 외양의 화려함을 좇아 거침없이 달려온 산업화와 신도시의 개발로 그늘에 가려졌던 구 도심이 이제 문화예술의 옷을 입으며 새롭게 변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1세기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도시적 형태가 유사한 일본 요코하마는 2002년부터 150년전 개항을 전후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과 산업시설을 문화와 예술 중심으로 활용하고 보존하는 정책으로 '창조도시'로 거듭났으며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또한 큰 도시로 발전했다. 인천시도 요코하마 못지않은 풍부한 역사적 자산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재생을 위한 인천시 정부의 철학과 방향, 구체적인 실행의지 등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지난 날 인천시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도시의 꿈을 좇았다면, 이제 구 도심의 역사적 자산에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창조도시로 가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