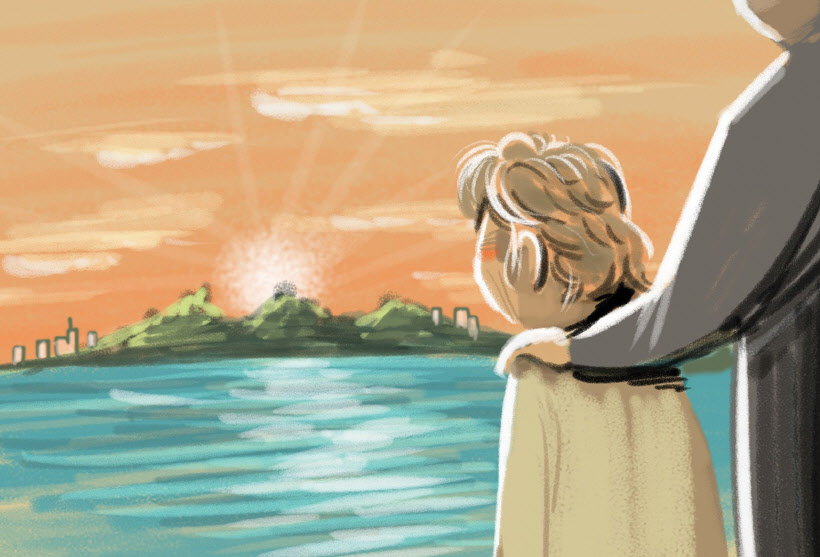
1950년 9월13일 새벽 5시, 월미도 상공에 굉음과 함께 유엔군의 공군기 1개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내 하늘에서 기름통과 네이팜탄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어떤 이는 새벽잠에 빠져 있다가 고스란히 타죽었고 잠에서 깬 이들은 속옷 차림으로 도망갈 곳을 찾았다. 비행기가 사람만 보이면 기총사격을 해대는 통에 갯벌에서 펄 흙을 잔뜩 뒤집어쓰고 숨죽여 있기도 했다. 간신히 인천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폭격이 잦아든 틈을 타 월미도와 인천을 연결한 다리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숨진 가족과 이웃의 시신을 수습하던 이들에겐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틀 뒤인 15일 인천상륙작전이 본격 전개됐고 함포사격을 피해 다시 고향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리고 끝이었다.
월미도 원주민들이 고향을 잃은 사연은 한국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처럼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것도 아닌데 고향은 꿈속에나 남아있다.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고향에 머물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은 타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와 비슷하다.
사실 주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고향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그들은 고향을 눈앞에 두고 다리 앞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군부대가 철수하면 고향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역대 인천시장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향수병을 달랬다. 하지만 그 약속은 '희망고문'이었다. 미군은 철수했지만 대신 국군 제2함대사령부가 주둔했다. 이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공원이 들어섰다. 결국, 휴전 후 한국을 지배하던 안보논리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귀향은 번번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기까지 69년이 걸린 셈이다. 이 소식을 접하니 십수년 전 취재현장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의 절규가 귓가에 맴돈다. "죽기 전에 고향에 보내달라고 시장에게 말하려는데 순사들이 못 들어가게 해!" 청원경찰을 순사로 알고 있는 그 할머니는 당시에도 상당한 고령이었다. 주름진 눈가를 훔치던 그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
/임성훈 논설위원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