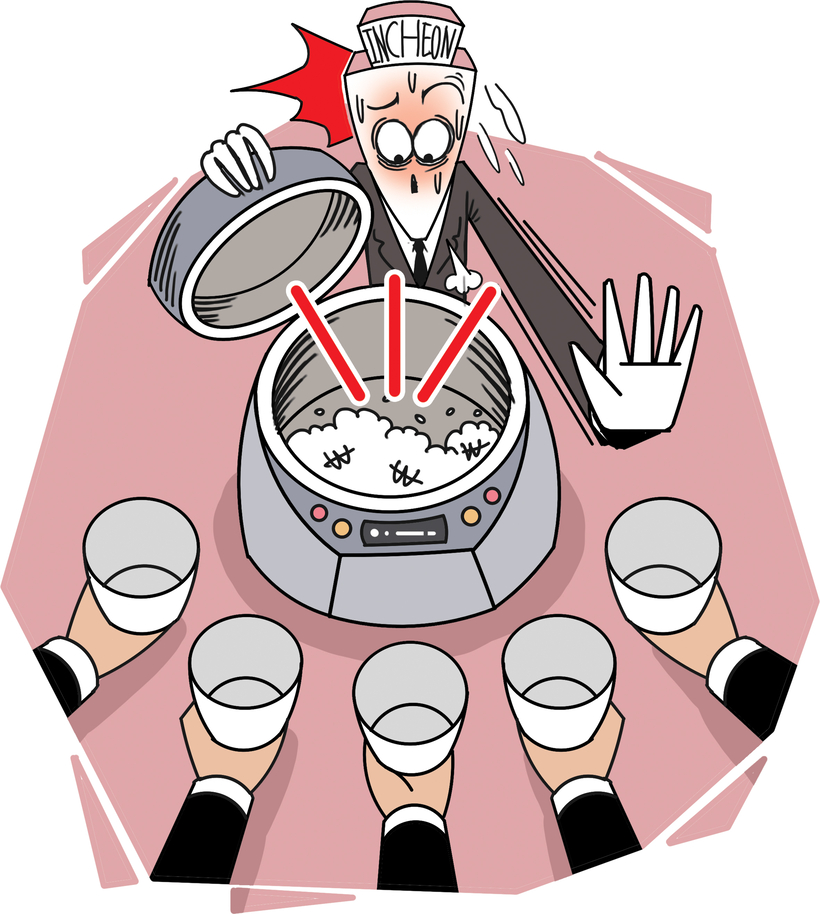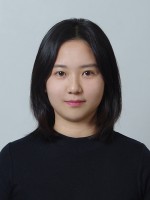초기 치료후 '근로 가능' 판정땐
'휴업급여' 받지 못해 무급휴직
노동 강도·업무 특성 고려 안해
"직장 복귀율이 40% 밖에 안돼"
경제적 어려움 유발 '제도 한계'

안양지역에서 일하는 15년 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해 중순 폐암 1기 판정을 받았다. 아직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더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탓에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쉬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몸도 아팠고 폐암에 걸린 환경에 다시 들어가는 게 두려워 질병휴직을 냈던 건데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십몇 년을 일하다 뜻하지 않게 병을 얻고 실업 상태가 된 건데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28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는 경우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산재로 일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폐암 1기 등 암 초기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들이 무급으로 쉬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해도 무방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때문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손익찬(일과사람) 변호사는 "암 초기의 경우 절제술을 하고 나면 항암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호흡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노동강도가 높은 급식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 작업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직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우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산업보건의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릴 때 산재법은 원직복귀가 아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며 "이런 탓에 한국은 직장복귀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해당 기준을 바꾸거나 산업보험 외에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업급여를 받는 조건인 '요양'이라는 판단은 온전히 의학적 소견의 영역"이라며 "급식실 노동자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영역인데 제도로 일반화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