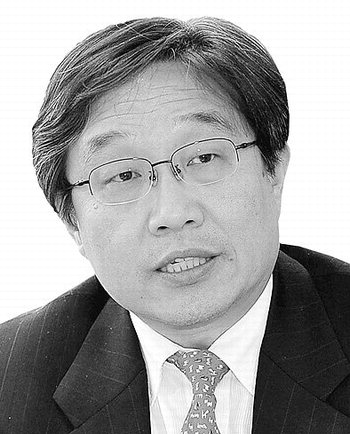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선진기업들을 추월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가꿔온 윤리의식은 따라잡지 못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업윤리 수준이 높다. 일본 기업은 직원에 대한 배려가 많으며 이윤을 사회에 돌려준다는 의식도 강하다. 일본기업의 강한 윤리의식은 자신들의 영웅인 시부사와 에이치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그의 책인 '논어와 주판'의 영향이 컸다. 그는 사혼상재(士魂商材), 즉 선비와 같은 절개와 도덕, 그리고 상인으로서의 재능을 겸비하는 것이 기업가의 이상임을 강조했다. 1930년 이전 일본기업들은 시부사와의 영향권에서 탄생했다. 마쓰시타 전기를 비롯해서 샤프와 히타치 등은 시부사와 정신의 계승자답게 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또 이 정신은 현재까지 잘 전수되어 신생 기업들조차 윤리 경영에 적극적이다. 우리가 아직 일본경영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남아있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쪽만 학습한 편이다. 부를 추구하는 기업가의 욕망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학습했지만, 기업가의 최고 덕목인 위험을 돌파하려는 도전정신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안일한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업가정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수익을 창조하려는 유전자를 말한다. 우리는 아쉽게도 미국 기업가정신의 진면목인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직 기업가의 부에 대한 욕망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표면적인 논리만 받아들이다 보니, 시장을 어지럽히고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것도 기업인의 덕목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급기야 엉터리 장사꾼들이 설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오해가 있다. '기업은 이윤을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바로 그것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말도 아니다. 경제적 가치의 창출은 사회에 큰 도움이며 기업의 고용효과는 중요한 사회 공헌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얻고 그것을 기업가가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오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기업가의 금전 지상주의를 인정해 주고 그 욕망을 견제하는 것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고 오직 쉬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개인 주머니만 불리는 방책이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기업윤리 체계가 망가진 상황임을 생각할 때, 개인적 차원의 의식전환에만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다. 개인의 무모한 탐욕은 두려움을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철저해야 한다. 정부도 엄해야 할 때는 제대로 엄해야 한다.
/손동원 객원논설위원·인하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