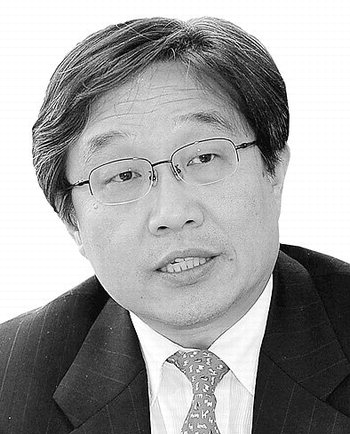
'공간 빌려주기' 관점은 시대흐름 뒤떨어진것
인센티브조차 없는데 '임대사업자 규정' 안돼
우리나라 창업보육의 역사도 15년을 넘어섰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벤처강국의 의지를 담아 신생 벤처들을 키우는 입주시설로서, 대학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범했었다. 그동안 스타 기업을 많이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 5천123개, 고용인원 1만7천276명, 매출액 1조6천592억원에 달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위상을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276개중 75%인 207개가 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대학이 창업보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창업보육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신생 벤처에 혜택을 베푸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비용과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영리조직에서는 창업보육을 맡을 이유가 없었다.
창업보육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보니 많은 창업보육센터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최소한의 외형을 유지하는 선에 머무는 기관도 많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수익 인센티브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창업보육시스템에서 양질의 벤처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보육은 신생기업에 혜택이 되지만 창업보육센터 입장에서도 최소한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의 창업보육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여하려는 정책이 대학 창업보육을 흔들고 있어 안타깝다. 이 정책에 의해 사립대의 경우 재산세를 내고 국립대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대학은 현재 보육공간의 입주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얻는다. 물론 영리적인 가격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공성 기조로 운영됨에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학은 공간활용도로만 따진다면 창업보육보다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전략적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해결 의지와 달리 다른 부처들의 오해로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금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하고 재산세 100%감면 방침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들의 오해는 대학의 창업보육이 대학 고유사업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최소한의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지목한다. 그런데 창업보육은 본래 대학고유사업이었지만, 산학협력단 조직 출범에 의해 외형만 이관됐을 뿐이다. 대학의 재량적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분장만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넘어간 것이다. 즉, 외형상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을 뿐 실제는 공공적 속성이 여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부턴 오히려 창업보육을 통한 창조경제의 성공의 길을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스타 벤처들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보육은 이미 비즈니스의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창업보육은 공간 제공뿐 아니라 경영 멘토링과 사업자금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로 진화해 왔다. 즉, 신생 벤처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분을 얻고 그 지분회수에 의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라는 변종 사업자가 등장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벤처인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기업들이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키운 벤처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판국에 창업보육을 '공간 빌려주기'로 보는 관점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 분명하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얼마의 수익을 얻는지, 형식논리에 더 이상 빠져있을 틈이 없다. 대학의 창업보육은 그 자체가 완결판이 아니라 창조경제를 움직이는 시작점인데, 여기에 활력이 없다면 창업 강국의 희망은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 수익 인센티브조차 없는 창업보육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과세하면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손동원 객원논설위원·인하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