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여성들이 변하고 있다. 과거 한국에 시집와 며느리로 정착했던 이들 여성들은 당당히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시집와 며느리, 엄마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터득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억척스런 그녀들을 만나봤다.
# 미얀마 출신 마킨메이타(47)씨는 20년 전 한국땅을 처음 밟았다.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친척 덕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마씨는 1993년에 한국 유학길에 올랐다. 2년간의 유학 생활 도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마씨를 도우며 함께 정을 쌓았다. 이로 인해 마씨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유학을 마친 뒤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지만 마씨는 2년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마씨는 이미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이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만인 1998년 10월, 마씨는 오랜 기간 만남을 가져 온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다. 마씨는 "정착 초기에 언어 소통 문제로 고생이 많았다. 한국어가 서투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당시만 해도 미얀마 국적의 이주여성이 거의 없어 이런 문제를 얘기할 데가 없었고, 자연스레 외로움이 깊었다"며 정착 초기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렸다.
그런 마씨를 일으킨 것은 가족이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현재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마씨에겐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마씨는 또 입버릇처럼 "시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교사 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시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한국에서도 자신의 적성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뚜렷한 직업없이 궂은 일을 전전하는 대다수의 이주여성들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타국에서 20년의 시간 동안 한 가정 속에서 아내로, 며느리로, 또 엄마로 살며 어려움을 이겨내 온 마씨. 이 뿐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또 자원봉사자로서 지역 내 아이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들을 돕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 중국에서 온 서홍화(38)씨는 하루 하루가 매일 바쁘다. 주중에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주말에는 토요학교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서씨는 얼마 전부터 다문화 여성들을 돕는 일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다름 아닌 다문화상담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것.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에 서씨는 바쁜 시간을 쪼개 틈틈이 자격증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서씨는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지만 하루빨리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싶다"며 "자격증을 따면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씨가 이처럼 상담에 매진하게 된 것은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씨는 "낯선 나라, 생소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발생하며 때론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조언을 제시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현재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다문화 아이들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적인 상담법을 터득하기 위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한국에서 만난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서씨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자식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아직도 다문화라는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삶이다 보니 참고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서씨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각종 문화 교육과 행사, 공연 등이 많아져 이제 다문화라는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자연스레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때문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이 곳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상·김태성·황성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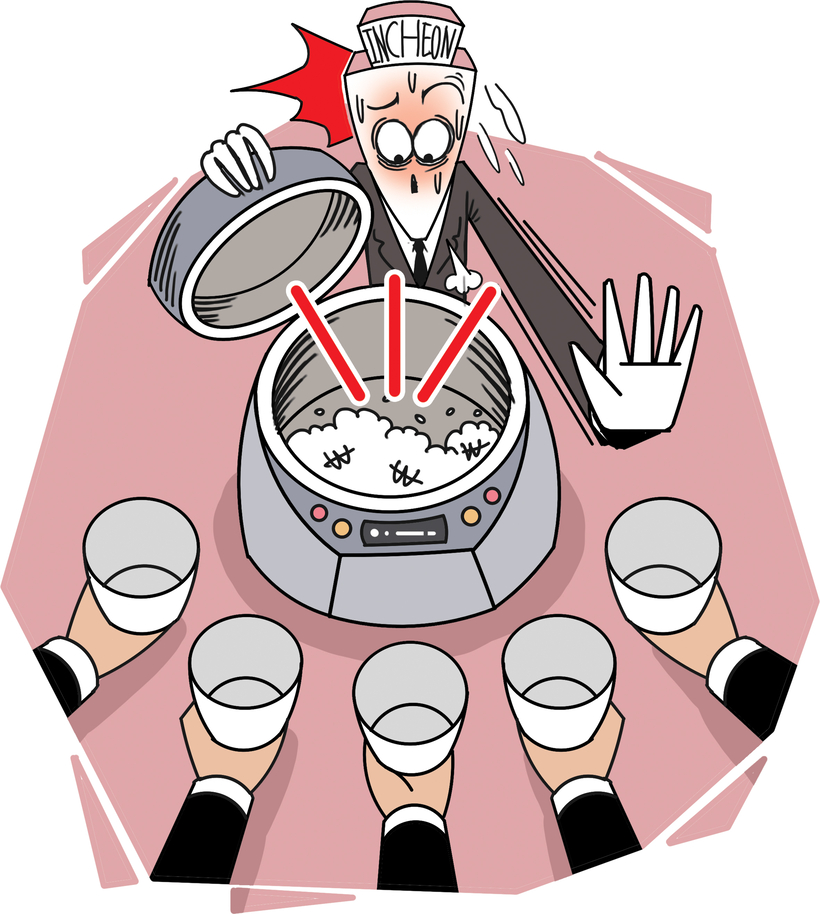






![[힐링, 희망을 품다]다문화, 이제는 공존이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209/676445_261149_3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