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자·피아니스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걸음마 떼듯이 음악과 함께 성장
어디서 누구와 연주해도 최고기량 발휘… 수년간 '국내 최연소 악장' 자리지켜
바이올린 말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단 한번도 없느냐고 짓궂게 여러번 물어봐도 그는 한사코, 절대로 '나에게는 바이올린 뿐'이라고 했다. "어릴적에 잠깐 오락실에서 게임에 빠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올린 외에 관심을 가져본 것이 거의 없어요. 바이올린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가 바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실이라니. 정말 내세울만한(?) 딴 짓은 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하나 악장의 이야기다.
사실, 정하나 악장의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그의 외길인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초대 지휘자 고(故)정두영 교수와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정강씨의 넷째아들이다. 덕분에 젖병 떼면 숟가락질을 배우듯이, 걸음마를 떼고 나면 달리게 되듯이, 음악을 당연한 성장과정으로 여기며 자랐다.
정하나 악장은 지난 2004년 부모님께서 프랑스에서 사주신 바이올린을 "유산이라 생각한다"며 매우 아꼈지만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것은 음악을 사랑하도록 설계된 유전자와 평생 음악과 동반할 운명인 듯하다.
일상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습하던 그는 16살에 미국에서 '키다리 선생님'을 만나 음악적 성장급등기를 맞았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키가 2m는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분은 다정한 말투로 진심이 담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칭찬을 받으며 음악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죠."
고등학생 때는 그를 무대 체질로 만들어 준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여름방학마다 한국에 왔는데, 언젠가 대전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를 가서 연주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제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였고 여자만 보면 수줍고 얼음이 돼서 말도 잘 못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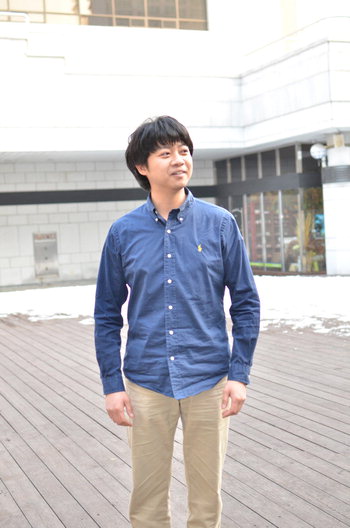
고등학교 안에 있는 강당에서 했는데, 또래 여학생 2천명이 가득 찬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창 사춘기였던 만큼 말 그대로 황홀했고 동시에 엄청나게 떨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연주를 했고, 연주가 끝난 후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마치 인기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죠. 자신감 없고 위축돼 있던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연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이스트로 활동하며 무대의 조명과 박수를 혼자서 누리고 싶었을만도 한데, 그는 오케스트라를 선택했다. "오케스트라는 나름 매력이 있고, 저는 그 매력이 좋아요. 특히 경기필은 그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원들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오케스트라인만큼 활기차고 절도있으면서도 무엇이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 서른 한 살이 된 그는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광주시향에서 경기필로 올 때까지 줄곧 '국내 최연소 악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했다. 스스로를 '연습의 노예'라고 말하는 그는 오는 11월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한국에서의 첫 독주회를 연다. "어디에서 누구와 연주를 하게 되든, 저의 목표는 내가 가진 기량 안에서 최고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뒷걸음 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며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민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