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초기부터 '2025년 종료' 원칙
대체지 확보, 주민 반발 쉽지 않아
폐기물 처리과정도 획기적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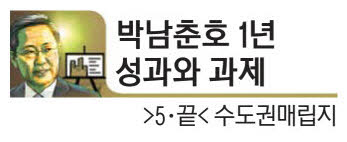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애초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4자 합의'라는 인공호흡으로 겨우 2025년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다.
박남춘 시장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불 보듯 뻔하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출범 초기부터 '2025년 종료 원칙'을 내세우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막상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동 진행했던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 준공이 다가오자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걸음 떼기도 버거워 보인다.
3개 시·도는 대신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천500억원을 인센티브로 내걸고 수도권매립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기로 선회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조성은 1980년대 후반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 만큼 이번에도 환경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청했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기피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넘는 곳의 쓰레기를 홀로 감당하겠다고 나설 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꺼내 든 카드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에 따라 각자 처리하자는 대안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을 핑계로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부지가 넓은 경기도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시 팽창으로 매립장 조성이 불가능한 서울시가 고립된 형국이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로 본격 선회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외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종량제 봉투째 땅에 묻는 폐기물 직매립 대신 소각 잔재물만 처리하려면 소각장 증설이 필수이나 이 역시 기피시설이라 주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
또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부터 수집, 운반, 선별, 처리로 이어지는 폐기물 흐름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시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견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다'는 원칙만큼은 확고하다"며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질질 끌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있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4)구·신도심 균형 발전]한쪽 치우치지 않는 성장동력 '기초 다지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0901000757600035781.jpg)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3)일자리]노동약자 보호 질적 성장 핵심… 시장직속委 '컨트롤타워' 역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0701000519700024061.jpg)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2)소통 협치]갈길 멀어도 '시민 목소리 더불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0401000413200018961.jpg)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1)서해평화협력시대]어장 확대·백령공항… 접경지 주민 체감 성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7/2019070301000247300010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