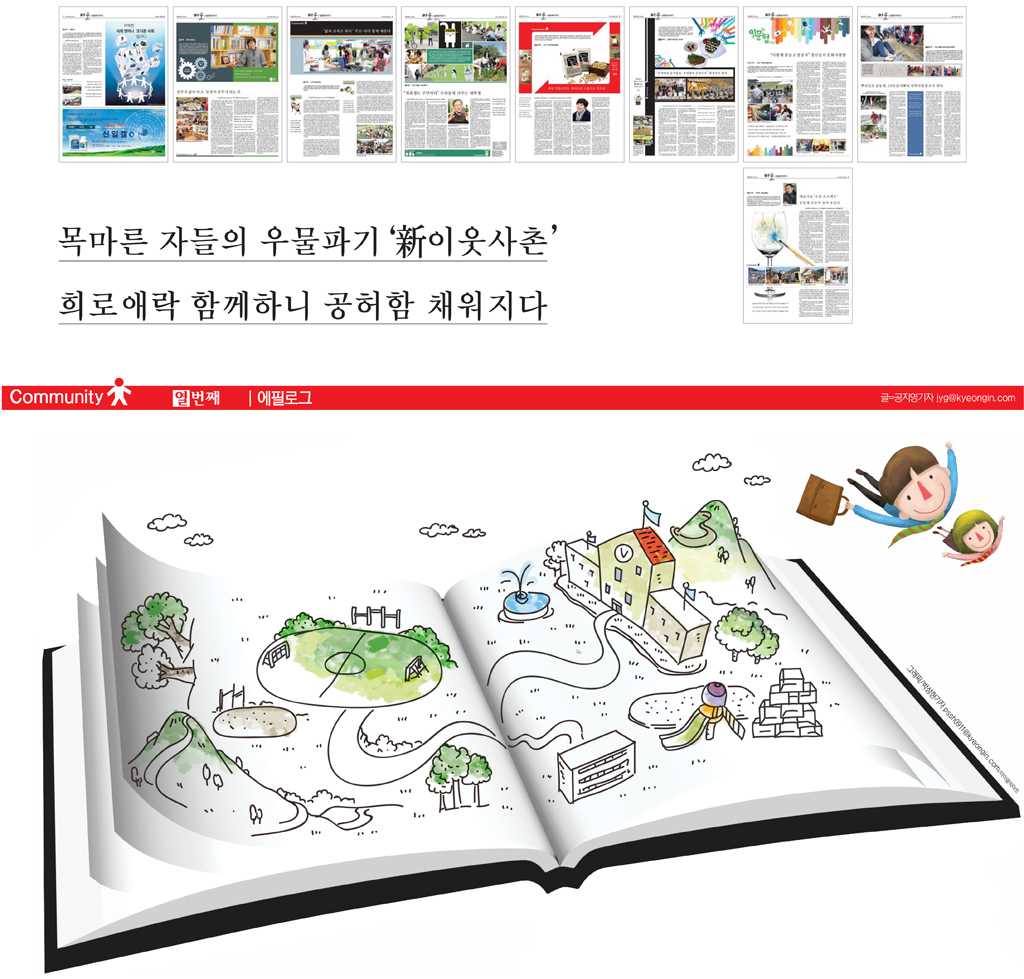
자생위한 강한의지 중요 “정부 지원에 길들여지지 말라” 경고
피한방울 안섞인 타인들 강요보다 ‘느슨한 연대’로 접근해야
사소함이 가져온 무서운 변화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 여운 남겨
마을이 사라졌다.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개인주의가 현대인의 상징인양 자랑스레 여겨졌지만, 우리 마음속 어딘가는 공허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을 공동체이야기’는 그 공허함을 위로받고자 시작됐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한 시대에 다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스스로 용기를 낸 이들의 이야기였다.
지난 3개월 간 경기도 내 8곳의 마을 공동체를 만났다. 교육과 경제, 생활문화예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동하면서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지면을 통해 대부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마을을 소개했지만, 취재 중 만난 모든 공동체가 좋은 결과를 얻은 건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례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꼭 맞다. ‘문탁네트워크’와 ‘무지개교육마을’, ‘행복한 칠보산마을공동체’는 시대의 철학과 교육에 대한 깊은 갈증에서 비롯됐다.
밥벌이를 고민하던 주민끼리 힘을 모아 탄생한 곳이 ‘잔다리마을’과 남양주 ‘아낙네’다. ‘혼밥’이 일상이 된 젊은이들과 세월의 흐름에 황폐화 돼버린 마을주민들의 고독은 한양대 자토펙토와 이웃문화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만, 이들 공동체가 지금까지 무사히 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자생(自生)’을 향한 강한 의지와 느슨한 연대다.
이들의 시작점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정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의 힘만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거나, 성장의 과정에 물밑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외부의 물질적 지원은 마을 공동체가 제 모습을 갖추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공동체들은 하나같이 ‘정부 지원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포천 교동마을 구제 프로젝트를 지휘한 ‘문화살롱공’의 박이창식 대표도 “정부가 주는 달콤한 열매에 맛을 들이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필요 이상의 외부 지원에 대해 마을 주민 스스로 냉정해져야 하고 자생하려는 의지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담그는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남양주 ‘아낙네’의 주민들도 “정부 지원을 받던 시기보다 우리가 투자한 농산물과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지금의 만족감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했고, 행복한 칠보산마을공동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한가위축제 운영비를 몇해 전부터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다. 대신 우리끼리 십시일반 모아 축제를 진행하니 즐거움은 두배가 됐다”고 털어놨다.
느슨한 연대는 의외의 결론일 것이다. 피 한방울 안 섞인 ‘남’과 함께 길을 가야 하는데, 단단해도 모자랄 판에 느슨함이라니. 여기서 되짚어봐야 할 지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피가 안 섞인’ 타인들의 연대라는 것이다.
문탁네트워크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칙을 발명한다. 대의제를 차용하지도, 매뉴얼을 정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다”고 말하며 공동체 규칙의 성질이 단단하지 않아 끈 같으면서, 연기 같다고도 표현했다.
10여개 공동체가 연합된 칠보산마을공동체도 “절대 함께 하길 강요하거나 억지로 상황에 맞추려고 하진 않는다. 공동체로 뭉쳐 있다지만, 사실 가족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공동체 스스로 뭉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레 하나로 모이는데, 15년간 함께 한 주민 간 이어져 온 정서적 공감대가 그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들과의 만남을 돌이켜 보면 사소함이 가져온 무서운 변화들에 새삼 놀라게 된다. 비슷한 목마름을 가진 이들이 모여 미약하게 공동체를 창조했지만, 이들 삶의 변화가 주변의 삶으로 번져가는 양상은 심히 창대했다.
공부와 게임밖에 모르던 아이가 지나가는 마을 어른에게 자연스레 인사하는 작은 변화가 어른들의 삶에 주는 변화를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소심한 관심들이 모여 이들 공동체를 배우고 따라 하려는 실천 속에 더 많은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람 사는 ‘내’가 퍼져나가고 있다.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처럼 이들은 외치고 있다. “우리 욕심 내지 말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글=공지영기자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마을;공동체 이야기]다섯번째┃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2/940531_501808_5201.jpg)
![[마을;공동체 이야기]여섯 번째┃남양주 마을기업 ‘아낙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2/942374_503447_4640.jpg)
![[마을;공동체 이야기] 일곱 번째┃수원 ‘이웃문화협동조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2/945330_506519_4800.jpg)
![[마을;공동체 이야기] 여덟 번째┃수원 ‘행복한 칠보산마을 공동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3/947263_508402_1548.jpg)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홉 번째┃의정부 ‘문화살롱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3/950917_512099_0410.jpg)